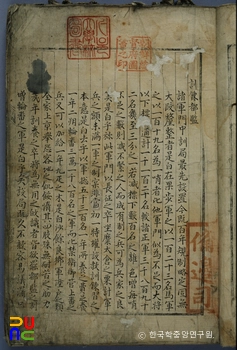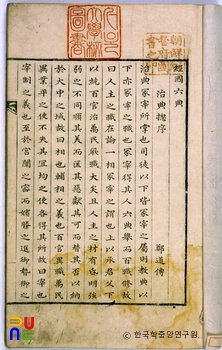섀도 어 슬롯 강화 중인 ()
섀도 어 슬롯 강화은 조선시대에 양반과 양인의 중간신분계급층이다. 원래 중등 정도의 품격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면서 중간신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주로 서울 중심가에 살던 역관·의관·산관·율관·화원 등의 기술관을 총칭하여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 했으나 경외 지역에서 일하는 향리·서리·역리 등의 행정실무자를 포함하여 이르기도 했다. 천차만별의 직역을 가지고 있어서 직역에 따른 사회적 대우와 국가의 반대급부가 달랐고 섀도 어 슬롯 강화층 내에서도 신분 간의 차이가 컸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지식은 근대사회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근대 전환기에 크게 부각되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는 용어는 비단 조선시대 중간신분층의 뜻으로뿐만 아니라 중등 정도의 품격(品格)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도 했다.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후자의 뜻으로 쓰여 온 셈이다. 전자의 뜻으로 쓴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한편 고려시대의 사료에는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고려사』에는 “개성부(開城府)의 5부와 외방(外方)의 주현은 백성으로서 양반을 삼고 천인으로서 양인을 삼아 호구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자는 법에 의거해 처단하였다.”라고 하여 신분 개념으로서의 양반 · 양인 · 천인은 보이나 섀도 어 슬롯 강화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아직 신분 분화가 철저하지 못해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 불릴 만한 중간신분층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결코 중간층에 해당하는 신분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 재편성기인 조선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섀도 어 슬롯 강화 신분이 성립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신분 개념으로서의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 신분 개념으로 쓰인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이러한 섀도 어 슬롯 강화도 두 가지 용례가 있다. 하나는 서울의 중심가에 살던 역관(譯官) · 의관(醫官) · 산관(算官) · 율관(律官) · 음양관(陰陽官) · 사자관(寫字官)·화원(畫員) · 역관(曆官) 등 기술관(技術官)을 총칭하는 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관뿐만 아니라 향리(鄕吏)·서리(胥吏) · 서얼(庶蘖) · 토관(土官) · 장교(將校)·역리(驛吏)· 우리(郵吏) ·목자(牧子) 등 경외(京外)의 행정실무자들을 총칭하는 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이다. 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도 그들의 거주지가 서울의 중심부인 데서 생겼다는 견해와, 당론(黨論)에 가담하지 않는 중립분자들이기 때문에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는 명칭이 생겼다는 견해가 있다.
“조종(祖宗)의 제도에 섀도 어 슬롯 강화과 소민(小民)에게는 조시(朝市) 근처에 머물러 살도록 허락하여 그 생리(生理)를 편하게 했으니 이것이 중로(中路)의 이름이 나온 까닭이다.”라고 한 데서 보이는 섀도 어 슬롯 강화은 전자에 속하고, 현은(玄檃)의 주장은 후자에 속한다.
즉 현은은 그의 <섀도 어 슬롯 강화내력지약고(中人來歷之略考)>에서 당론에 들지 않는 사부(士夫)의 유족(裕足)으로 실용학문을 세수(世守)한 청족(淸族)을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 한다고 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연원에 대하여는 섀도 어 슬롯 강화 세가의 보첩(譜牒)을 살펴보면 세수관직이 대개 10세 안팎인 점을 들어 당론이 처음으로 일어난 때라고 하였다.
그가 섀도 어 슬롯 강화, 즉 기술관을 미화하여 양반과 다를 바 없는 사부의 유족인 청족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 자신이 섀도 어 슬롯 강화 명가(名家)의 하나인 천녕현씨(川寧玄氏)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 개념은 조선 중기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현은도 “섀도 어 슬롯 강화의 연원이 사부의 유족됨은 명확하되 그 칭호를 얻은 증거가 자세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중종시대에 얻었다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부와 상인(常人) 사이에 존재해 얻었다.”라고 말하여 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 칭호가 조선 중기부터 쓰여 왔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 칭호가 조선 중기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중간신분층을 총칭하는 광의의 섀도 어 슬롯 강화 칭호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쓰이게 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의 가좌표(家坐表)에 ‘중(中)’으로 표기된 신분을 ‘향(鄕)’의 아래이고 ‘양(良)’의 위라 하고, ‘향’은 ‘토관의 무리’라 하며, ‘양’은 ‘낮으나 천하지 않은 자’라 했으니 섀도 어 슬롯 강화은 향족과 양인 사이에 있던 중간층임을 알 수 있다.
『균역사목 均役事目』에서는 유족한 양인으로서 교생(校生)이나선무군관(選武軍官)이 된 자들이 스스로 섀도 어 슬롯 강화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양인에서 섀도 어 슬롯 강화으로 상승한 부류이다. 이러한 산발적인 신분층으로서의 섀도 어 슬롯 강화 개념은 이중환(李重煥)의『택리지 擇里志』와황현(黃玹)의『매천야록 梅泉野錄』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섀도 어 슬롯 강화은 비단 기술관만이 아니라 서얼 · 서리 · 향리 · 장교 · 방외한산인(方外閑散人) 등 광범한 신분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섀도 어 슬롯 강화, 즉 중간계층으로서의 섀도 어 슬롯 강화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간신분층을 의미하는 섀도 어 슬롯 강화 개념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사용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중간신분층으로서의 섀도 어 슬롯 강화 개념을 조선 후기에만 국한해 써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조선 초기까지 소급해 써도 무방하다.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성립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은 양인 · 천인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신분 명칭으로 적합하다.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은 조선시대의 다른 어떤 신분층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위로는 양반층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축들이 있는가 하면 아래로는 천인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축들도 있다. 이것은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이 천차만별의 직역(職役)을 가지고 있어서 직역에 따른 사회적 대우와 국가의 반대급부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 신분은 직역을 담당하는 전제가 되지만 반대로 직역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기도 하였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의 내부구조가 복잡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이 이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신분 간의 차이도 컸다.
이는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에 잘 나타난다. 같은 섀도 어 슬롯 강화층 안에도 정3품 당하관(正三品堂下官)이 한품인 기술관과 정5품이 한품인 토관과 정7품이 한품인 서리를 구별하였다. 향리 · 역리 · 우리 · 목자는 아예 관계(官階)도 없었으나 향리는 대체로 토관에 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층 안에도 또 다른 몇 개의 층이 있었다.
기술관 중에도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인 역관 · 의관 · 산관 · 율관 등 상급기술관과 정7품 참하관(正七品參下官)이 한품인 천문관 · 도류(道流) · 화원 등 하급기술관과 잡직계(雜職階)를 받는 잡직기술관이 있었다. 그러나 잡직기술관은 섀도 어 슬롯 강화이 아니라 천인이 담당하는 관직이었다.
기술관 중에도 간혹당상관이나봉군(封君)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특별한 예에 불과하다. 향리에도 호장층(戶長層)과 육방향리층(六房鄕吏層)과 색리층(色吏層)의 세 층이 있었다. 호장층은 수령의 고문역을 맡고, 육방향리층은 이 · 호 · 예 · 병 · 형 · 공 육방의 직임을 분담했다. 색리층은 기타 각종 이역(吏役)을 담당하였다.
고려시대의 향리도대상(大相)·중윤(中尹)·좌윤(左尹) 등의 향직을 받는 호장층과 병정(兵正)·창정(倉正) · 옥정(獄正) 등의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층(記官層)과 각색잡무를 담당하는 사층(史層)이 있었다. 색리층을 천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양반의 입장에서 천역이지 양인 · 천인들의 입장에서 천역은 아니다.
이것이 천인이 담당하는 잡직과 다른 점이다. 또한 고려시대에 향리가 맡았던 주현군(州縣軍)의 도령(都令) · 별정(別正) · 교위(校尉) 등 도군직(都軍職)이 조선시대에 장교로 바뀌었다. 따라서 장교는 섀도 어 슬롯 강화층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주현군의별장(別將)은 호장층이,교위·대정(隊正)은 기관층이 담당한 것으로 보아 장교에도 두 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리에도 녹사층(錄事層)과 서리층(書吏層)의 두 층이 있었다. 녹사는 양반의 음직(蔭職)으로 활용되기도 한 상급서리이다.
서리는 말단 이속들을 총칭하는 하급서리였다. 서리는 유품관(流品官)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향리와 일치하나, 일정한 정품(定品)을 받는다는 점에서 향리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쉽게 일반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섀도 어 슬롯 강화은 대체로 양반에는 미치지 못하고 양인보다는 우위에 있던 조선시대의 중간신분이라든가, 양반에서 도태되거나 양인에서 상승한 자들이라는 것은 공통된 점이다.
양반들은 생산노동은노비에게 맡기고 복잡하고 민심을 잃기 쉬운 대민업무는 섀도 어 슬롯 강화에게 일임한 채, 자신은 시부(詩賦)를 즐기며 왕도정치를 구가할 수 있었다. 양반들은 섀도 어 슬롯 강화을 행정사역인(行政使役人)으로 역사(役使)하기 위해 이들을 신분적으로 얽어매고 관념적 · 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별하였다.
이에 섀도 어 슬롯 강화은 양반정권에 기생하면서 착취와 비행을 자행했다. 행정실무에 종사하는 까닭에 그들은 언행이 세련되고 생활이 깔끔했으며 대인관계에 밝았다.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쓰는 문서양식도 따로 있었으며, 시문(詩文)까지도 독특하였다. 따라서 가히 섀도 어 슬롯 강화문화(中人文化)라고 할 만한 생활규범을 갖추고 있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이 담당한 업무는 양반사회에서는 2차적이었으나 근대사회에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었다. 따라서 근대화에서는 섀도 어 슬롯 강화층의 진출이 어느 신분층보다도 뚜렷했다. 섀도 어 슬롯 강화은 양반문화에 대한 집착이 적었고, 또한 그들이 습득한 지식이 새로운 체제에 적용하기 쉬웠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