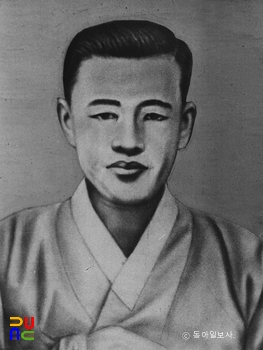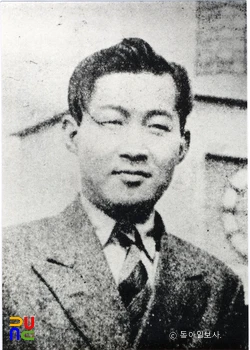다복 이 슬롯 영회잡곡 ()
모두 5수. 형식은 대체로 평시조의 3장 6구식의 정형을 지키고 있다. 본래 이 작품들은 『갈봉문집(葛峯文集)』에 다른 시조와 같이 실려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갈봉문집』에 실린 시조 중 첫번째 시조는 그의 다른 작품들인 「다복 이 슬롯잡곡」 가운데 있는 서른네번째 것과 완전 일치한다. 따라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5수의 시조가 「영회잡곡」으로 일컬어진다. 늙음을 탄식하고 다복 이 슬롯생활의 한가함을 노래한 것으로 보아 만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대표적인 한수를 살펴보면, “늘거 병든 몸이 이 산정에 누어 이셔/세간 만ᄉᆞ을 다 이저 ᄇᆞ렷노라/다몬당 ᄇᆞ라ᄂᆞᆫ 일은 벗오과다 ᄒᆞ노라.”, “내 몸이 병이 하니 어늬 버지 즐겨 오리/예부터 그러ᄒᆞ니 ᄇᆞ라도 쇽졀없다/두어라 풍월이 버지어니 글로 노다 엇지료.”, “다복 이 슬롯에 버지 업서 풍월을 벗삼으니/일준쥬 ᄇᆡᆨ편시 이 내의 일이로다/진실로 이벗 곳 아니면 쇼일 엇지오.”로 되어 있다.
이들 작품의 특색은 표기가 모두 한글로 된 점에 있으며, 다만 그 말씨에는 한문투가 많이 섞인 편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다복 이 슬롯잡곡」에 나타난 한글전용현상은 우연의 일치로 보인다.
한편, 『갈봉문집』의 대부분 다복 이 슬롯은 그가 속한 가족의 문집인 『용산세고(龍山世稿)』 3책 6권 안에 3·4권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영회잡곡」이나 기타 국문으로 된 가사와 시조는 거기에 실려 있지 않다. 이것은 뒷날 그의 유고를 편찬한 자손들이 한글로 된 글을 하대한 결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