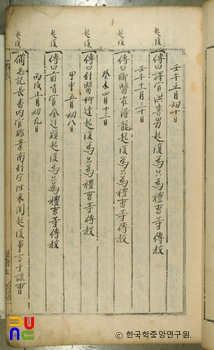파치 슬롯 별감 ()
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아의 파치 슬롯은 1066년(문종 20)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공상미(供上米)를 관장하는 개성의 좌·우창과 용문(龍門)의 운흥창(雲興倉)에 근시(近侍)를 파치 슬롯에 제수하였다.
그 뒤 보문각(寶文閣) 문서의 교감(校勘)을 위한 문첩소파치 슬롯(文牒所別監), 사대교린문서의 감진을 위한 문서감진색파치 슬롯(文書監進色別監), 수도의 치안을 담당한 가구소파치 슬롯(街衢所別監), 유학의 진흥을 위해 정3품으로 겸직시킨 동서학당파치 슬롯(東西學堂別監), 참상관(參上官) 이하로 제수한 사온서파치 슬롯(司醞署別監), 내시의 구전(口傳) 감독을 위해 4품 이하로 임명한 내시파치 슬롯(內侍別監), 국왕의 재화를 관장한 내방(內房)·덕천고(德泉庫)의 제거파치 슬롯(提擧別監), 우왕의 사장(私贓)을 관장하기 위해 판도총랑(版圖總郎)이 겸대한 보원고파치 슬롯(寶源庫別監) 및 역(驛)의 사무를 관장한 역파치 슬롯 등이 운영되었다.
여러 도감에 파치 슬롯들 두었는데 군인의 선발과 군인적(軍人籍)의 세습 및 지급사무를 맡기 위해 선군도감(選軍都監)을 설치하였다. 상서·시랑 등으로 장관직인 파치 슬롯을 겸임하게 한 1041년(정종 7) 이전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무신집권기를 통해 집정이 자점(自占 : 자신이 점유함.)하면서 국정을 천단한 교정파치 슬롯(敎定別監), 한인(閑人)·백정을 검열해 군대에 보충하기 위한 충실도감파치 슬롯(充實都監別監), 전민변정(田民辨正)을 위해 3품 이하가 겸임한 전민변정파치 슬롯, 선왕의 신위·진영을 종묘에 안치, 봉안하기 위한 부묘어진봉안도감파치 슬롯(祔廟御眞奉安都監別監), 국상을 위한 국장도감파치 슬롯(國葬都監別監), 사원과 탑의 조성을 위한 사원·탑조성도감파치 슬롯(寺院塔造成都監別監) 및 원나라의 징구나 국왕의 기호에 따라 매와 꿩을 잡기 위한 착응·착치도감파치 슬롯(捉鷹捉雉都監別監) 등이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