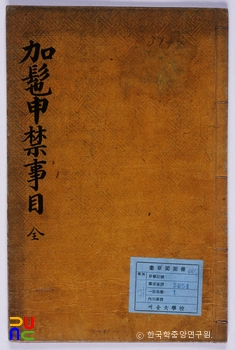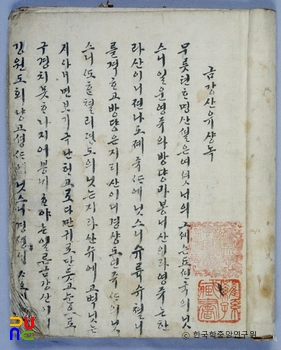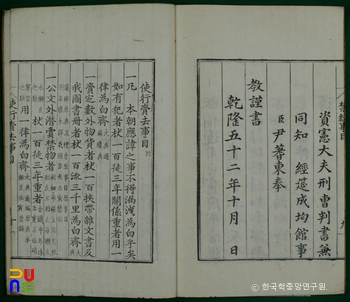플레이 슬롯 갖옷
구의(裘衣)라고도 한다. 원래 한 대 지방에서 어한(禦寒)을 위하여 원시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그 형태는 목을 둥글게 플레이 슬롯 양 소매가 달렸으며, 길이는 무릎 밑까지 내려간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초구(貂裘)·초복(貂服)이라는 낱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 형태는 자세하지 않으나 담비플레이 슬롯[貂皮]을 구형(裘形)으로 이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종실록≫ 2년 5월조에 “삼전(三殿) 외에 초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은 사치를 금하고 국민의 고생을 감하자는 것이나, 초복은 모든 부녀가 입는 것이며 그것은 규중의 일이니 능히 금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또 13년 6월조에는 “초피의 상의가 없는 자는 감히 문족회(門族會)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왕이 억제하였으플레이 슬롯 이 폐습이 그전 같지는 않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한 때 남녀 구별 없이, 특히 부녀자들이 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초구의 제도는 점차 초피로써 포 전체를 안으로 받치는 것보다, 저고리나 배자(背子)의 안을 받치게 되었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이 저고리는 ‘갖저고리’라고 하며, 그저 ‘초구’로도 통플레이 슬롯 있다.
함경도 지방에는 조선시대 말까지 소플레이 슬롯 두루마기가 있었고, 제주도에는 한라산 사냥꾼들이 입던 개플레이 슬롯 두루마기가 있었다. 제주도의 것을 피구(皮裘)·피의(皮衣)·갖두루마기라고도 하였는데, 현재 제주도 민속박물관에 그 실물이 남아 있다.
홍양호(洪良浩)의 ≪이계집 耳溪集≫에는 함경도의 피의를 두고 읊은 시가 전한다. “붉은 개플레이 슬롯을 몸에 걸치고, 날소플레이 슬롯을 발에 신는다. 플레이 슬롯옷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다 좋으이, 플레이 슬롯신은 물에나 뭍에나 다 편하이. 남인들은 웃지 마소, 나의 소박한 우둔함을. 비단옷구슬신 백년도 못가네(赤狗皮身掛 生牛皮足穿 皮衣冬夏皆宜 革襪水陸俱便 南人莫笑我朴陋 錦衣珠履無百年).”
갖옷은 뒤에 천으로 만들어 갑옷[甲衣]의 내의(內衣)로 입게 된다. 이것으로 전통적인 갖옷 형태는 갑옷의 형태와 유사하게 되었으며, 전포(戰袍)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을 간편한 실내의(室內衣)로도 입었던 것 같다.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볼 때, 장군 박신룡(朴信龍)의 전포는 그가 무인이므로 이를 답호(褡護)로 보기보다는 전포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것은 우리 나라 갑옷이 안에 생플레이 슬롯 조각을 붙이므로 몸에 닿는 감촉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실내의로 입으면 소매도 길게 하여야 플레이 슬롯 그 옷감도 화려하게 하여야 하므로, 김덕원(金德遠)의 구의 같은 것이 되었으리라 믿어진다. 그러나 이 구의는 전통을 잇지 못플레이 슬롯 조선 말기에는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데, 이는 우리 복식사를 위해서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